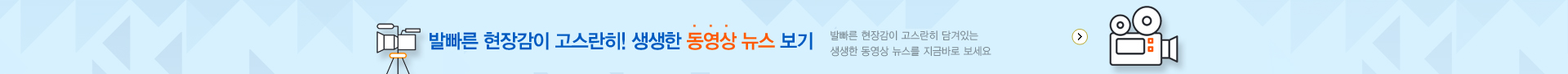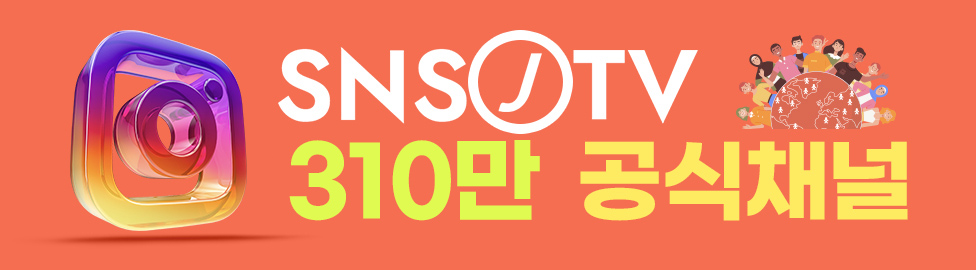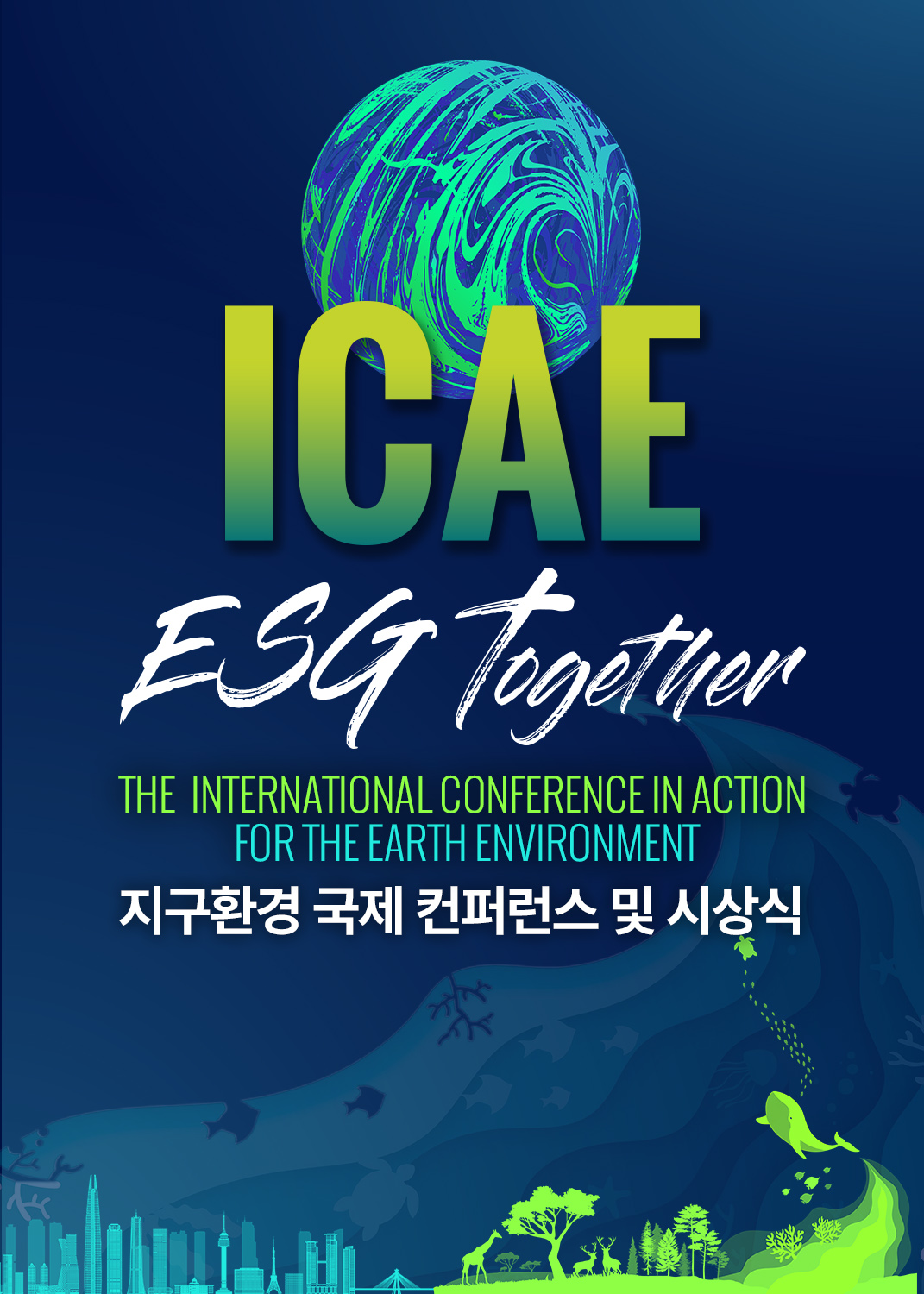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0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각국이 반도체 자국화를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는 고강도 수출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또한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커플링'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던 글로벌 분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장비 및 소재 의존도가 높아 미중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양측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동시에, 자체적인 기술 자립도와 생산 거점 다변화를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고부가가치 AI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유럽, 일본 등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능동적인 전략 수립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만이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보를 확보하는 길을 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