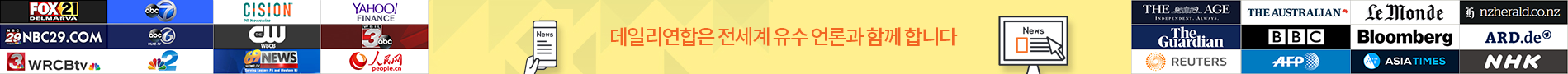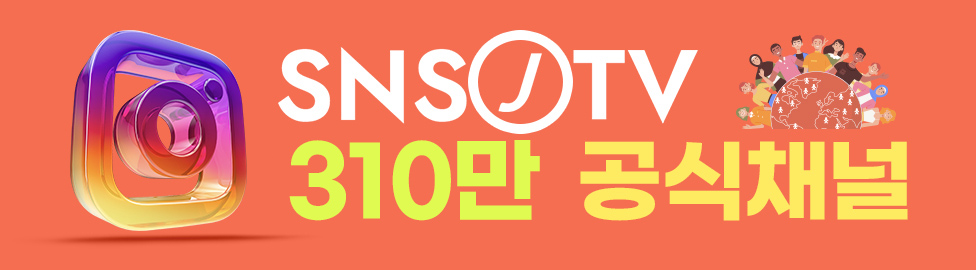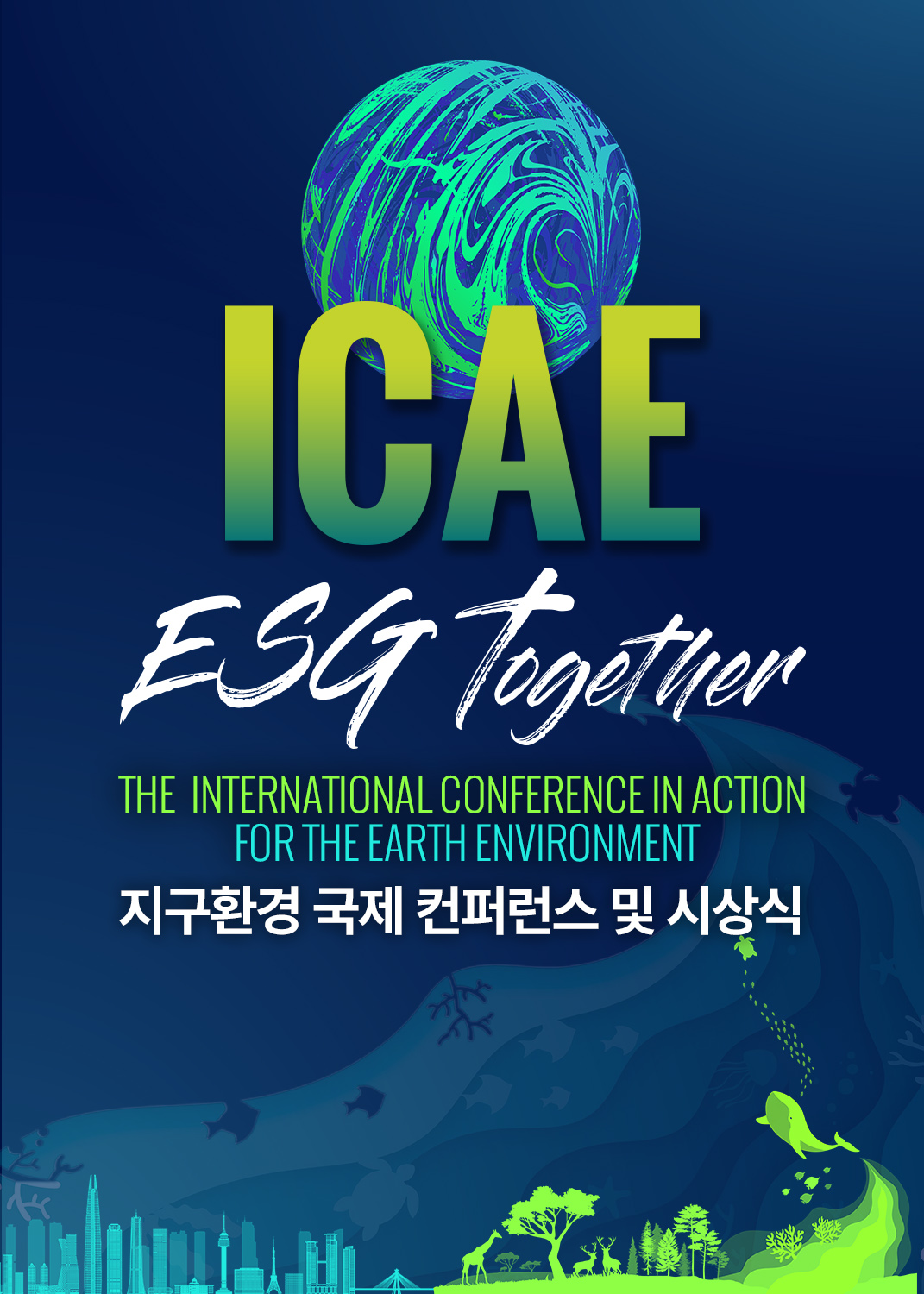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수면 아래 잠복하고 있던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년 2분기,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이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반등했다. 49억 달러에 이르는 순유입 규모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ESG에 대한 회의론과 정치적 반발, 규제 불확실성의 그림자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자본 흐름이 여전히 유효한 투자 프레임임을 입증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시장이 일제히 회복한 것은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전진했고, 미국은 후퇴했다.
▍유럽은 돌아왔고, 미국은 떠났다
ESG의 본진이라 여겨지던 유럽은 올 2분기 86억 달러를 다시 끌어들였다. 올 1분기 73억 달러가 빠져나간 바로 그곳에서 말이다. 그 중심엔 EU 금융감독당국(ESMA)의 펀드 명칭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펀드명에 ‘ESG’, ‘Sustainable’, ‘Green’ 등의 단어를 붙이려면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펀드 운용사들은 이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신뢰는 곧 돈으로 돌아왔다.
반면, 미국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ESG에 대한 정치적 반감과 제도적 혼선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텍사스주는 ESG와 DEI 관련 조언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Glass Lewis, ISS)를 규제하고 나섰고, 두 기업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주주제안에서의 환경·사회 안건 채택률도 3년 전 32%에서 최근 16%로 반토막 났다. 기업들은 'ESG'라는 단어조차 피한다.
같은 시대, 다른 궤적. 유럽은 ESG의 실천과 규제 정교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했고, 미국은 이념적 공격 속에 신중한 후퇴를 택했다.
▍아시아, 조용한 도약…태국이 중심에 섰다
2025년 2분기 전 세계에서 새로 설정된 ESG 펀드 중 절반 이상이 동남아, 그중에서도 태국에서 나왔다. 태국 정부가 시행한 ‘ESGX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ESG 펀드 시장을 자극했고, 그 결과 37개의 신규 펀드가 쏟아졌다. 이는 선진국 못지않은 정책 기반 ESG 확산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ESG를 ‘글로벌 규범’이나 ‘대기업 CSR’의 연장선에서 봤다. 그러나 아시아, 특히 신흥국가들은 ESG를 ‘성장 자본 확보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산 흐름의 방향, 주식에서 채권으로
흥미로운 전환이 하나 더 있다. ESG 펀드 중 채권형 펀드는 101억 달러의 순유입, 반면 주식형은 24억 달러 순유출이라는 상반된 흐름이다. 이는 단기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ESG 자금의 이동으로 해석된다.
초기 ESG가 '성장주'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ESG는 '지속가능한 안정 자산'이라는 신뢰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ESG는 전략이 아닌 구조다
지금이야말로 ESG를 '전략'이 아닌 '경영구조'로 내재화해야 할 시점이다.
-
미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ESG'라는 표현 자체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책임투자’, ‘장기 위험 관리’, ‘기업 회복탄력성’과 같은 용어로 의미의 전환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
유럽의 ESMA, 아시아의 지역별 분류체계, ISSB 보고 기준 등 복수 규제 체계에 대한 교차준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ESG 공시는 더 이상 단순 지표가 아니다. AI 기반의 ESG 리스크 분석, 데이터 대시보드, 정량적 설명 책임(Quantitative Accountability)이 요구된다.
▍반등은 시작일 뿐이다
2025년 ESG 펀드의 반등은 ‘시장 복귀’라는 표면 너머에 있다.
신뢰, 데이터, 지역별 대응, 기술 기반 투명성이 ESG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더 이상 '해야 하니까' 하는 ESG는 통하지 않는다.
'전략'과 '철학'이 맞닿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ESG가 새롭게 ‘진화’하는 시점이다.
그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기업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