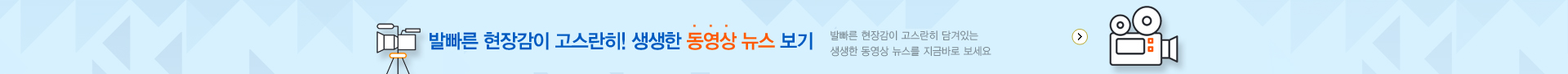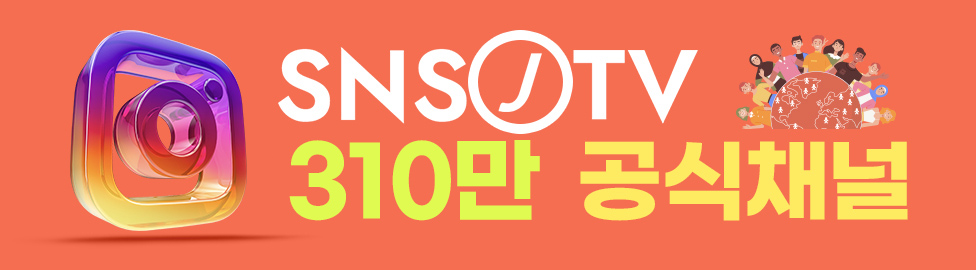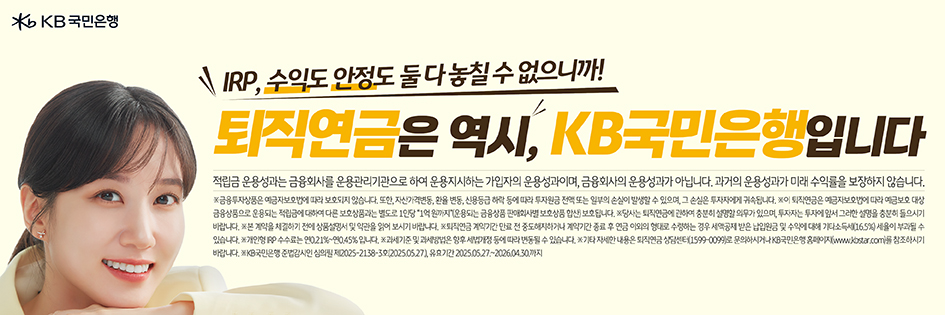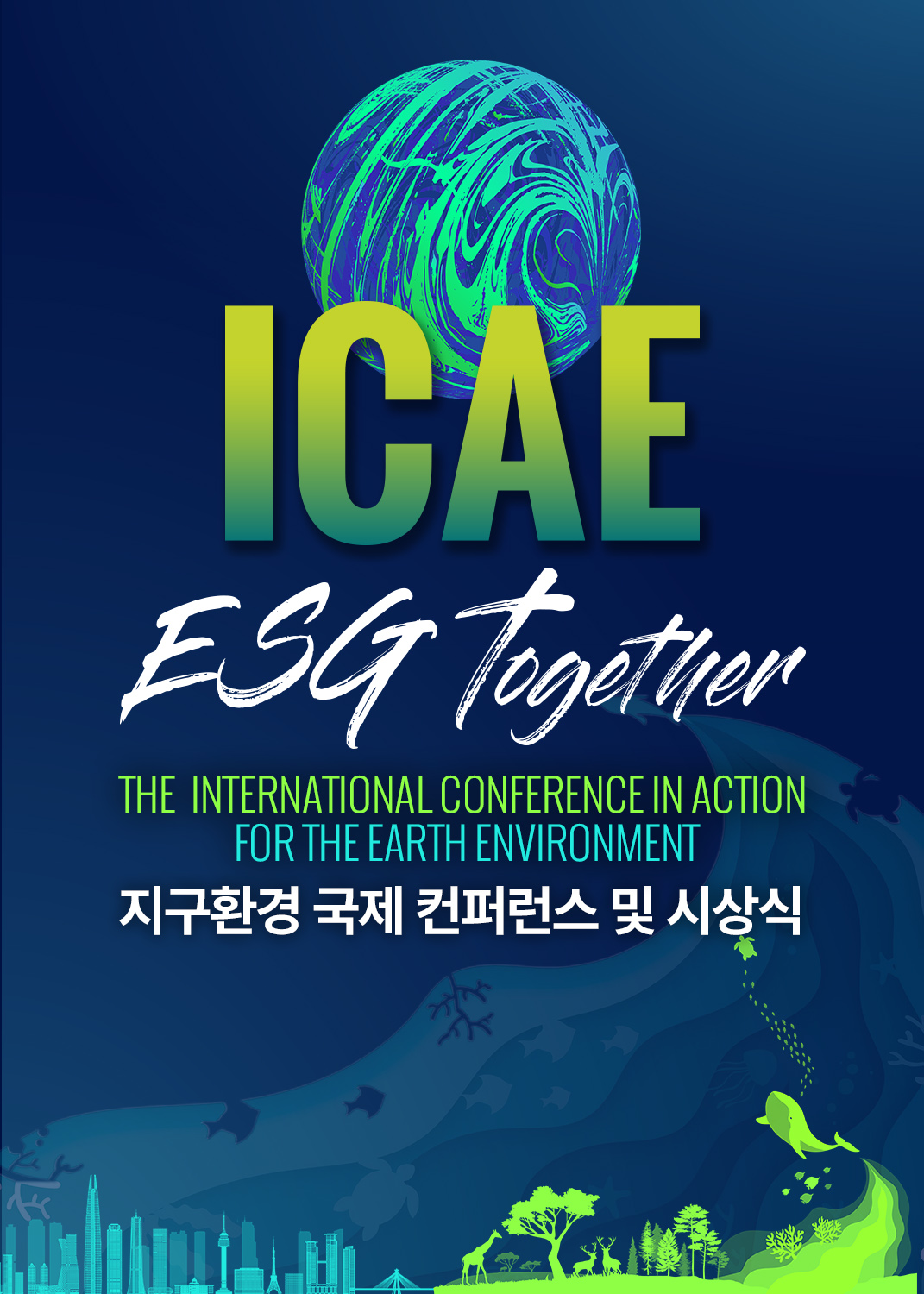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대한민국이 2025년 전후로 전 지역에 걸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지역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를 넘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며, 현행 인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섰으며, 이 같은 추세는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되고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도시들은 생산 인구 감소와 소비 시장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의료, 교육, 복지 등 필수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층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부양하고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농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인구 유입 및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단편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모든 연령층이 함께 살고 싶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 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소멸을 막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전방위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