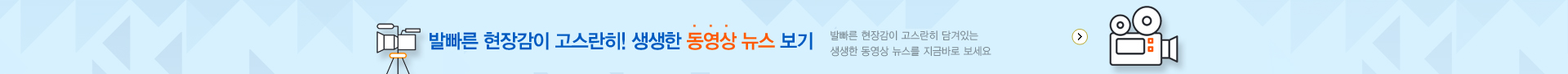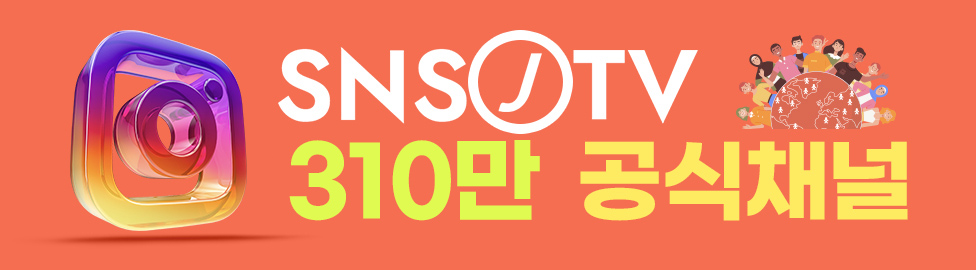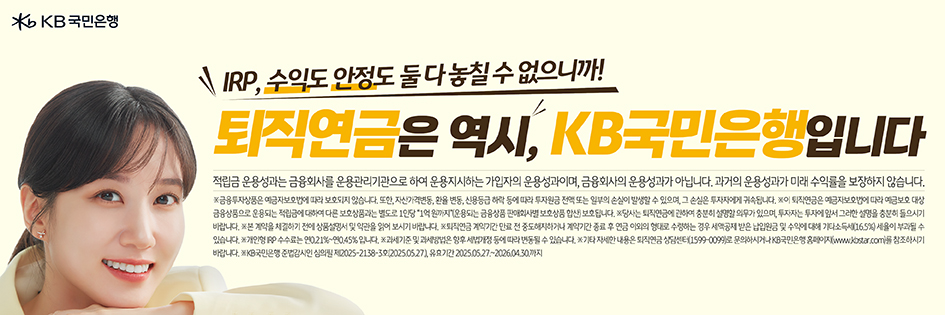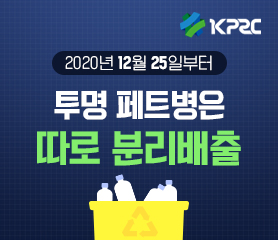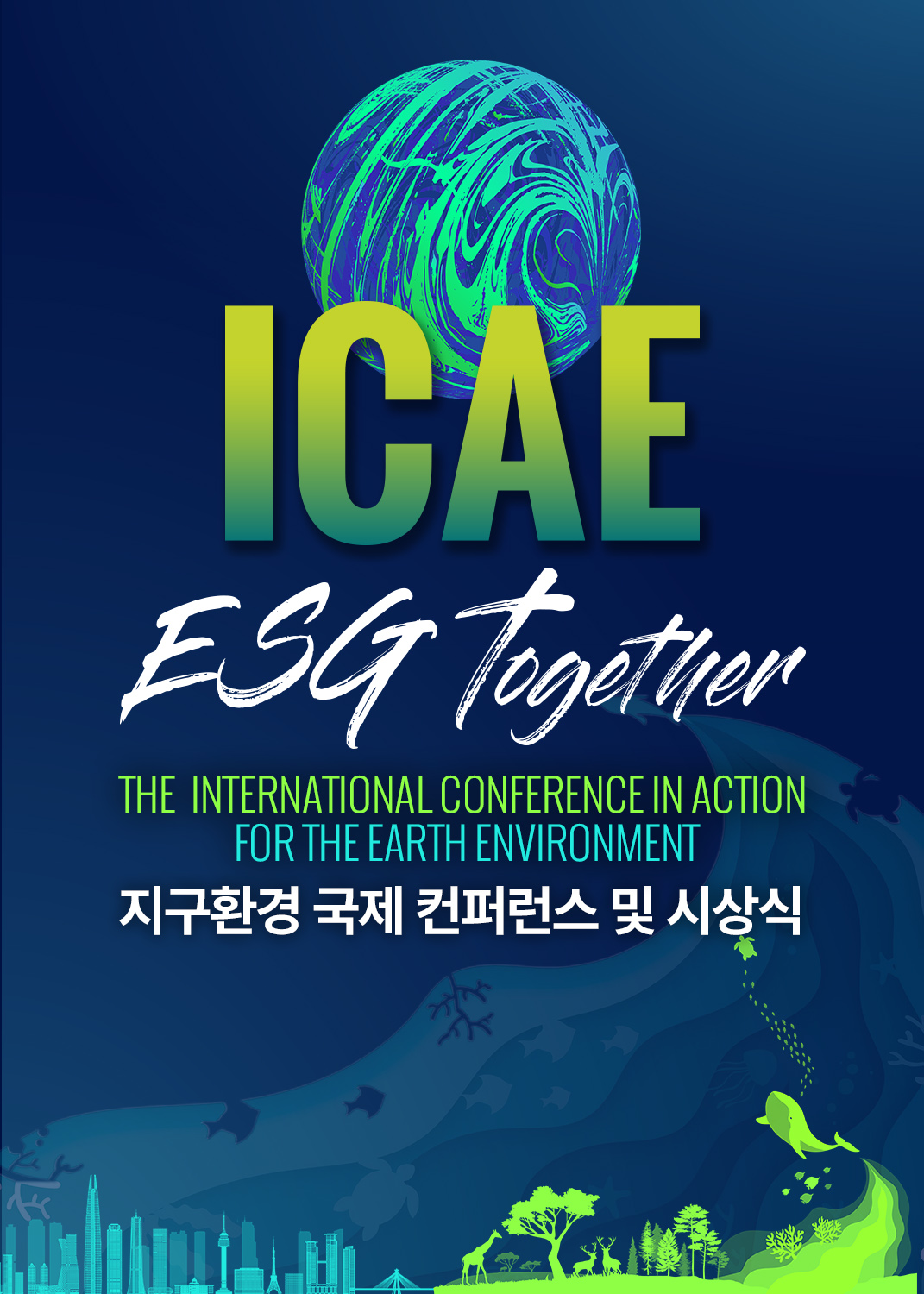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며 인구 절벽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십 조 원을 투입해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다. 2023년 기록한 0.78명을 다시 밑돌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자연 인구 감소 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2만 명대로 떨어졌고, 사망자 수(약 36만 명)를 크게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대 중반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15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울대 인구학과 이진우 교수는 “출산율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경제활동 인구 급감, 연금 시스템 붕괴, 지방 소멸 등 전방위적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수십 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출산 시 200만 원 지급(첫 만남 이용권) ▲매달 100만 원 지급(영아수당)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청년층은 정부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3) 씨는 “집값이 너무 비싸 결혼도 힘든데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육아 부담과 교육비를 고려하면 출산은 사치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워킹맘 이모(36) 씨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은 일부 대기업뿐”이라며 “출산 후 커리어를 이어가기 힘든 구조가 여성들에게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주거 안정 정책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청년층이 높은 전·월세 비용에 시달리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 임대주택 확충, 신혼부부 대상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이 실질적인 대책으로 제시된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문제다. 육아휴직 사용을 기업의 의무로 만들고, 육아 기간 동안의 경력 단절을 막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은 아빠 육아휴직을 적극 독려하고, 출산과 양육을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도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율 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된 지금,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