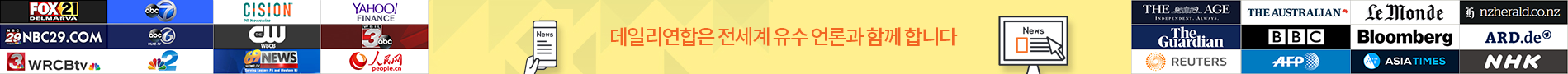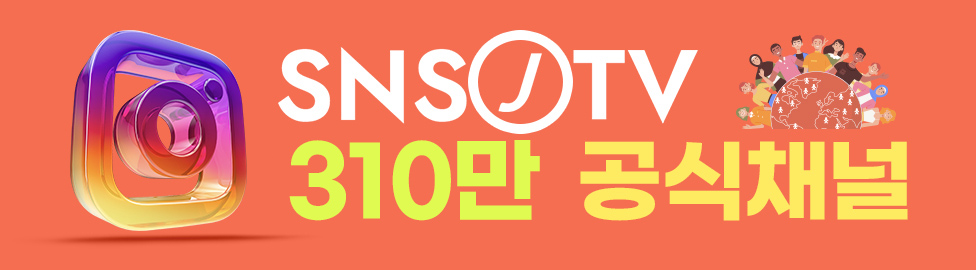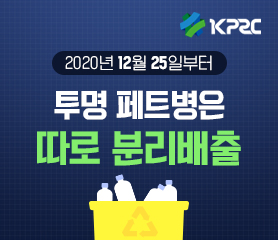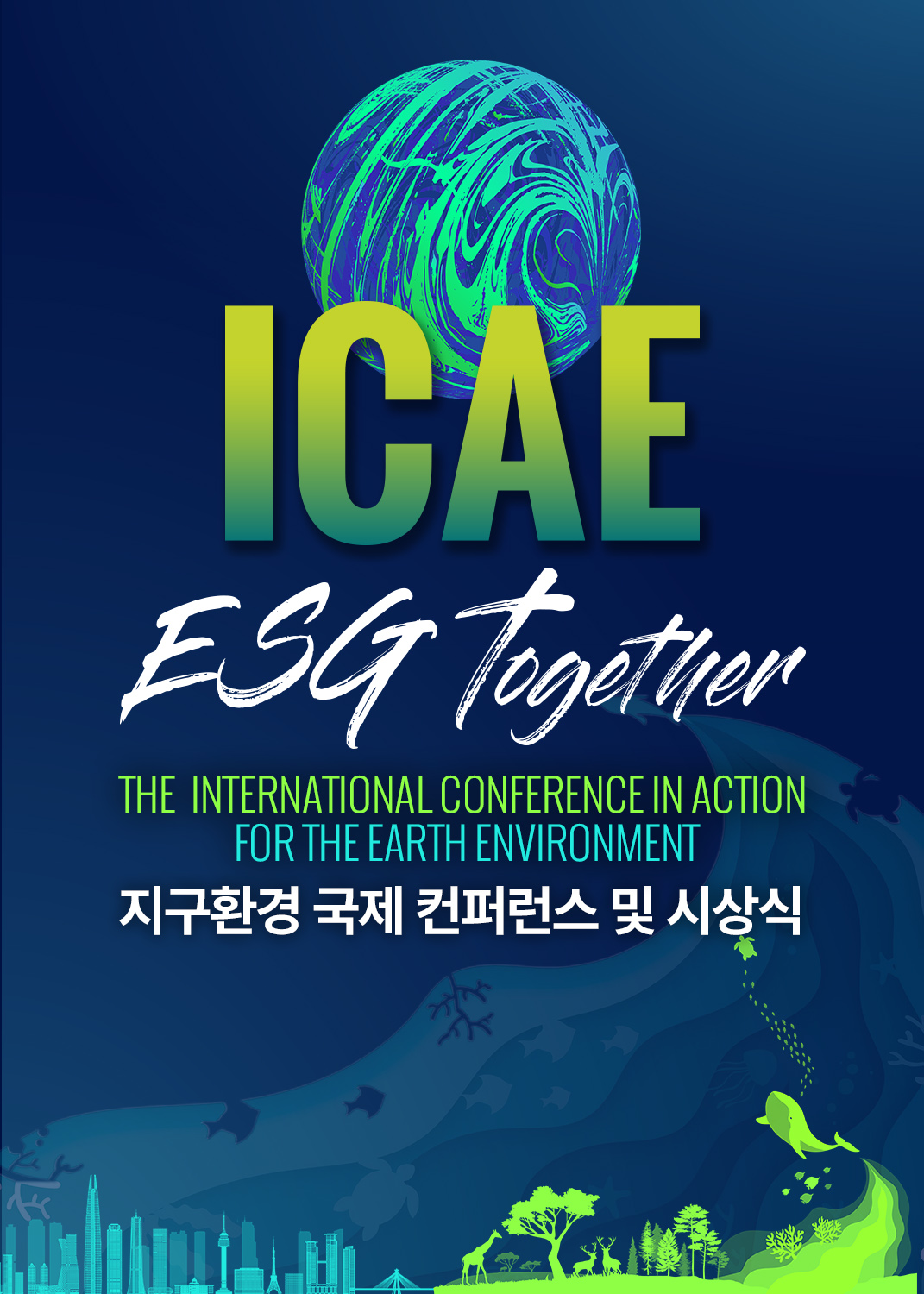논술이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면 ‘논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분류를 잘하고 순서에 맞게’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논술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류를 잘하고 순서에 맞게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다.
논술은 또한 ‘논술의 원리’에 따라서 써야 한다. 즉, 먼저 ‘논’하고 다음에 ‘술’하는 것, 다시 말해 먼저 주장하고, 다음에 그 주장의 의미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술문에서 전통적으로 채용되던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원계 논술전문가들은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은 과감히 버리라”고 조언한다. 인문계 논술 강사 출신인 김왕근 선생은 “서, 본, 결의 구조는 논제만 출제하고 제시문은 없는 과거 논술 유형에 맞는 방법”이라며 “여러 개의 과제 수행을 요구하면서 답안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제시문도 많이 주는 현재의 ‘한국형 논술’에서는 서, 본, 결의 구조로 쓸 여지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논술은 ‘논+술’의 구조로 답해야
논술을 ‘논+술’이라고 할 때, 이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논’이다. 논술 답안을 포함한 논설문은 주장과 주장의 연결로 이뤄져 있다. 핵심 주장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은, 엄밀성이 약간 훼손되더라도 전체적인 글에 큰 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 주장을 이루는 문장들 자체에 흠이 있다면 논설문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논술문을 쓰는 수험생들은 먼저 ‘논’을 확고히 정립하는 데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논’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논’을 ‘중심 문장’, ‘술’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논술과 비슷한 말로 ‘논증’이 있다. 논술이 ‘주장하고 설명함’이라면 논증은 ‘주장하고 증명함’ 혹은 ‘주장하고 근거 대기’다. 이렇게 볼 때 논술과 논증은 구조상으로는 서로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논증이 논술보다 더 엄격하리라는 것이다.
논술과 논증이 이렇게 같은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한다. 논증할 때 논리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논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처럼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도 논리 관계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이는 대입 논술 시험 답안 작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입 논술은 첫째, 논리적으로 답해야 한다. 즉, 문제가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잘 분류해서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답해야 한다.
둘째, ‘논+술’의 구조로 답해야 한다. 문장으로서 ‘논+술’의 구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구조와도 닮아있는 구조다. 우리는 어른이 “너 어디 가니?” 하고 물으면 “예, 학교 갑니다”하고 대답한다.
학교에 왜 가는지, 무슨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가는지, 언제 가는지 등은 그다음에 필요하면, 혹은 추가 질문이 있으면 덧붙인다. 그러지 않고 “아,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요, 한 30분쯤 후에 요 앞 네거리로 가서 버스를 타고..”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짜증을 낼지도 모른다.
논술 답안도 이와 같다. 문제가 “시민의 재판 참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일 경우, “시민의 재판 참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총론을 쓰고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덧붙이는 것이 순서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구술시험장에서 “시민의 재판 참여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견해들이 있었고 그 견해들을 분석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고..” 등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면 시험관은 “결론적으로 네 견해는 뭔데?”라고 묻고 싶어질 것이다. 이는 논술 시험도 마찬가지다.
논술 답안은 이렇게 ‘논+술’의 원칙, 그리고 문제가 묻는 순서에 따르는 원칙, 이렇게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작성된다. 사람들이 흔히 따르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는 논술 답안 작성 원칙에서 배제된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에 집착할 때, 위에서 제시한 논술의 진짜 원칙들이 침해받게 된다.
서론과 본론, 결론의 구조는?
논술 시험 중에서도, ‘논제’만 주어지는 시험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가 유용할 수 있다. 예컨대, 2009학년도 프랑스 대입 논술 시험 중에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용이한가?”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논제만 덩그러니 줄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작성하는 논문도 이런 형식으로 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형’ 논술 시험은 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도 함께 제공한다.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제시문과 관련한 여러 과제를 수행하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수험생은 문제가 요구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잘 분류해서 순서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
논술 출제자들은 “논술은 수험생의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를 하는 사고 과정까지 보는 시험”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까지 드러내면서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논술 답안 작성의 정석이다. 이렇게 문제의 요구에 맞추어 ‘논+술’의 순서로 답안을 작성할 때, 서론+본론+결론 형식의 작성법의 설 자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