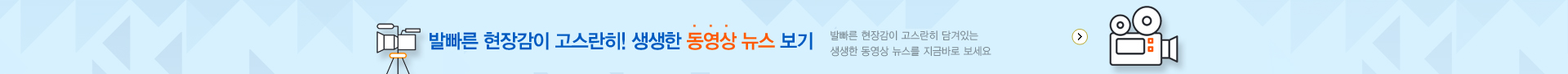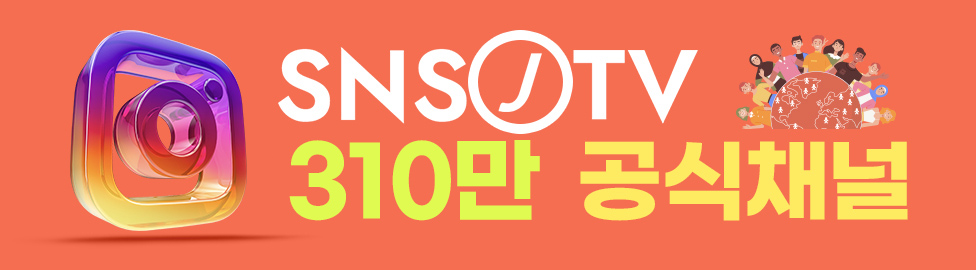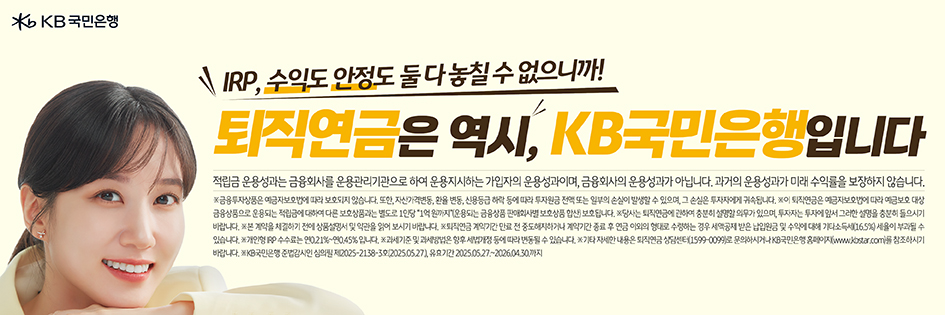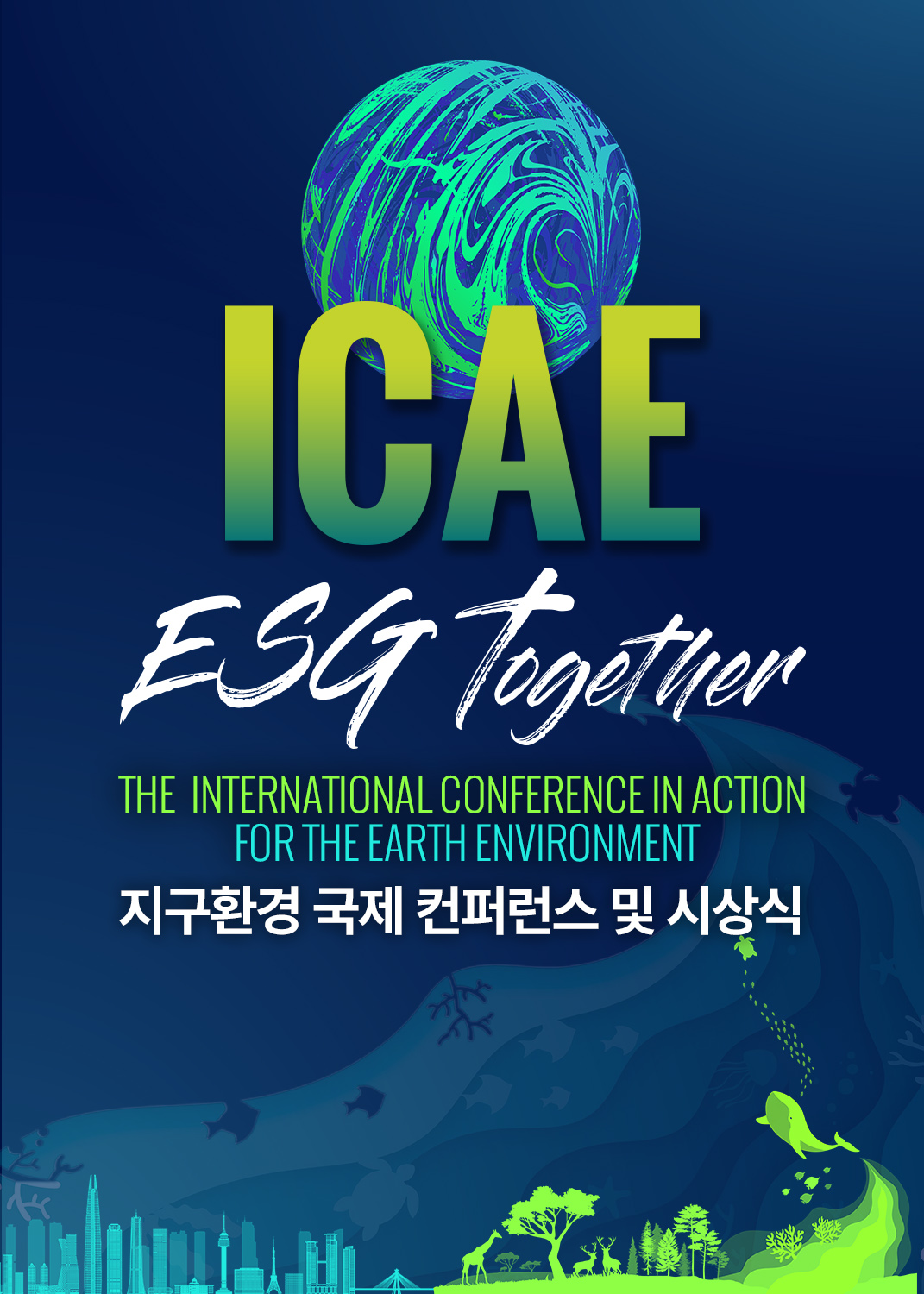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 패션업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환을 둘러싼 상반된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초패스트패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반면,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규제 강도를 완화하거나 시행을 늦추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초저가·고속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초패스트패션’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브랜드별 친환경 점수에 따라 아이템당 최대 5~10유로, 혹은 제품 가격의 50%까지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플루언서를 통한 패스트패션 홍보와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유입 경로를 직접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패션 산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유럽 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EU 차원의 정책은 다소 다른 방향을 보인다.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산림벌채 방지 규정(EUDR), 친환경 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등 굵직한 환경·노동 규제가 정치적 압박과 산업계 반발에 직면하면서 원래의 강도보다 완화된 형태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대규모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되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속 가능성 전환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 무대에서는 여전히 규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는 섬유·의류 부문을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TAS)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는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의 ESG 경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결국 패션산업은 강화와 완화라는 상반된 규제 환경 속에서 ESG 전략을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업계의 대응 여부에 따라 향후 지속 가능성 경쟁에서 명암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