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해외 350여 언론 주목… ‘지구촌 회복 위한 정신적 가치·실천’ 피력](//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5597612517_e53378_118x118_c1.jpg)
[ESG]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해외 350여 언론 주목… ‘지구촌 회복 위한 정신적 가치·실천’ 피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리더십이 전 세계 언론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의 최근 발언과 활동이 지난 20일 FOX, AP, 벤징가, NBC, CBS, ABC 등 해외 주요 언론매체 350여 개에 보도되었다고 밝혔다. 김회장이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지구촌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적 가치와 실천적 삶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두 회장은 UN SDGs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제적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특히, ICAE 지구환경 국제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며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 및 정책 결정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김 회장은 이들 매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올바른 미래 지도자 발굴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김용두 회장은 "ESG 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 탄소중립, ESG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회장은 그가 이끌고 있는 "SNS기자연합회와 TSN KOREA(스포팅뉴스), 데일리연합(SNSJTV)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강력한 협력과 실천을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두 회장의 리더십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글로벌 리더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올바른 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는 중동, 유럽, 아시아 등 여러 지역의 주요 지도자들과 협력해 지구촌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활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더욱 알려지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세계인들이 동참하고 있다. 김용두 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글로벌 활동을 통해 김용두 회장은 사회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회복하며, 전 세계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다. Sustainable Future ESG Vision : Yong-doo Kim, Chairman of SNS Journalists Federation in South Korea - ICAE 202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Action for the Earth Environment) Scheduled for November 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of Korea Yong-doo Kim, Chairman of SNS Journalist Federation & TSN KOREA, actively engages with leaders across various field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SG management,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conomic growth, and social accountability to global leaders and corporations.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ESG management are no longer optional but essential. Both businesses and individuals must take action as part of a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this era. Chairman Yong-doo Kim spearheads various global projects to highlight companies implementing ESG management and to expand discussions on sustainable futures. He host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erence annually, bringing together experts, businesses, and policymakers worldwide to explore solu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at Does a Sustainable Future Mean According to Chairman Yong-doo Kim? A sustainable future includes the following key elements: ✔ Proposing policies to implement all 169 UN SDGs ✔ Expand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ESG management ✔ Strengthening global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arbon neutrality ✔ Identifying and supporting outstanding companies and individuals practicing ESG management ✔ Enhancing education and media roles for a sustainable future ✔ Discovering and collaborating with future leaders in each country Based on these principles, Chairman Yong-doo Kim actively encourages businesses and individuals t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and social progress through innovative practices. “Climate change, carbon neutrality, ESG manage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urgent tasks that can no longer be postponed.” - Chairman Yong-doo Kim Global Leadership for a Sustainable Future –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erence & Awards To support and recognize global leaders practicing ESG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NS Journalists Federation organizes the ICAE International Conference & Awards annually. The SNS Journalists Federation spotlight companies and individuals committed to sustainability through this award ceremony. By sharing their success stories, they help expand the adoption of ESG management. Chairman Yong-doo Kim’s ESG Vision : Action Is the Answer! “Sustainable futures require ESG manage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UN SDGs. It is no longer a choice—corporations and individuals must act together to create real change.” – Chairman Yong-doo Kim ESG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now critical responsibilities, not only for global corporations but also for small businesses, startups, and individual investors. Chairman Yong-doo Kim leads discussions on ESG and sustainable futures through the SNS Journalists Federation, TSN KOREA, and Daily Union News (SNSJTV). He helps businesses and individuals explore concrete action plans. ‘Together’, Choosing a Better Future We now stand at a crossroads. It is time to identify and invest in the right future leaders. Moving away from extreme conflicts and disputes, efforts toward rational thinking and the restoration of humanity have never been more crucial. This year, through concrete action, the global community must come together. We must prevent history from regressing and ensure that future generations inherit a better world. The voices of responsible adults must grow louder to awaken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awareness. Chairman Yong-doo Kim said, “The SNS Journalists Federation, TSN KOREA, and Daily Union News (SNSJTV) will lead strong collaborations and actions for a sustainable future.” [해외 기사 텍스트]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2-26 15:07
-
![[이슈분석2] 티웨이항공, 대명소노그룹 말대로 "위기일까?"](//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1612119408_5295f0_118x118_c1.png)
[이슈분석2] 티웨이항공, 대명소노그룹 말대로 "위기일까?"
● 예림당 vs 대명소노그룹, 티웨이항공 지분경쟁 시리즈 -[이슈분석1] 대명소노그룹 vs 예림당, 티웨이항공 주인은? -[이슈분석2] 티웨이항공, 대명소노그룹 말대로 "위기일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티웨이항공(코스피 091810)의 경영권을 둘러싼 대명소노그룹(회장 서준혁)과 티웨이홀딩스(코스피 004870)·예림당(코스닥 036000) 간의 지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은 작년부터 꾸준히 티웨이항공의 지분을 늘려오며, 이제 티웨이홀딩스 및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가 불과 3.3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명소노그룹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을 제안하며, 티웨이항공의 재무 악화와 경영진의 무능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과연 티웨이항공의 실적과 재무 상황은 어떤 상태일까? 본지는 이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티웨이항공의 실적, 정말 위기인가? 최근 5년간 티웨이항공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20년~2022년까지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항공 수요 급감이 원인이었다.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모든 LCC 항공사들이 당시 적자를 기록한 만큼, 티웨이항공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2023년부터는 국경이 개방되면서 실적은 회복됐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 영업이익은 414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유럽 노선(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신규 취항에 따른 항공기 및 인건비 투자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높아지는 부채, 재무 건전성 괜찮을까? 티웨이항공의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503.3%, 2021년 1,452.7%, 2022년 1,655%, 2023년 717%, 2024년 9월 기준 73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간주되며, 티웨이항공의 부채비율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하지만, 부채비율에는 당장 갚을 필요가 없는 장기 차입금도 포함되므로, 단기적인 위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유동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유동비율이란 단기적인 현금과 부채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즉, 1년 안에 도래하는 부채를 당장의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티웨이항공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2020년 67.3%, 2021년 42.4%, 2022년 58.5%, 2023년 97.6%, 2024년 9월 기준 85.6%로 지난 5년간 100%를 넘지 못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보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지분싸움 하기엔... "둘 다 현금 없는데?" 현재 티웨이홀딩스(예림당 포함)는 티웨이항공 지분 3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명소노그룹은 26.77%를 확보한 상태다. 양측의 지분 차이는 3.37%로 주식수로는 7,25만 8,889주(약 247억 원, 2월 7일 기준 주가 3,4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단순한 지분 매입이 쉽지는 않다. 공개매수를 시도할 경우 주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각 그룹의 현금 보유량을 보면, 티웨이홀딩스는 현금성 자산이 30억 원, 단기 차입금이 70억 원으로 부족한 상태지만, 예림당이 34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응할 여력이 있다. 반면, 대명소노시즌은 1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소노인터내셔널이 비상장사인 관계로 추가 자금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권 분쟁, 제3자 주주들이 매우 중요 양측이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경쟁을 하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일반 주주들의 표심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은 자사주 매입을 2020년 단 한 차례(3만 주)밖에 하지 않았으며, 배당금 지급 이력도 없다. 따라서, 주주 친화적 정책 없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대명소노그룹과 티웨이홀딩스 간의 싸움은 공개매수보다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주주들의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가 티웨이항공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2-26 15:01
-
![[이슈탐사] LG그룹 상속분쟁 ① : 막장드라마 찍는 LG그룹 구광모 회장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0/art_17410627823216_9a11b3_118x118_c1.jpg)
[이슈탐사] LG그룹 상속분쟁 ① : 막장드라마 찍는 LG그룹 구광모 회장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
● LG그룹 상속 분쟁 막 나가는 LG그룹 구광모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 ① "천륜 저버린 구광모 회장?".. 양모 김영식 여사, LG그룹 파양 소송 논란 ②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LG그룹 구씨일가의 집안 싸움이 심상치 않다. LG그룹은 창업주 때부터 오랜 기간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구광모 현 LG회장과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족인 세 모녀 간 상속 분쟁,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집안 내 싸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조를 중심으로 투명 경영 등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LG그룹의 전통적인 승계 경영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광모 친부’ 구본능 회장, 형 금고 털었다!?.. '특수절도 혐의' 조사 지난 2월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故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특수절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구 전 회장의 유족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및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제기한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세 모녀 측 주장에 따르면, 故구본무 전 회장 별세 직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사장은 열쇠공을 동원해 LG트윈타워 내 고인의 집무실과 곤지암 별장을 찾아, 두 곳에 있던 고인의 개인 금고를 강제로 뜯어 내용물을 가져갔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故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으로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구광모 회장은 2004년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돼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지주사 LG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세 모녀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본능 회장 측이) 구본무 회장의 금고를 손괴해 그 안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언장의 의도를 훼손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 법원에 위증하는 등 오늘날의 문제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 측은 ”지난해 9월 민사소송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이 이뤄졌는데 그 부분을 다시 형사고발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에 영향을 끼치려는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본무 회장의 금괴를 손괴해서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흔들리는 장자 승계?.. 집안 싸움 배경은? LG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전통적으로 장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故구인회 LG창업회장, 故구자경 LG명예회장에 이어 故구본무 회장까지 무리 없이 장자 승계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구본무 회장은 슬하에 딸 둘 밖에 없었다. 장자 승계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 구본무 회장은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현 회장을 양자로 입적해 그룹의 후계자로 삼았다. 이후 구광모 회장은 2018년 구본무 회장의 별세 이후 LG그룹의 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안정적인 승계 경영을 이어가는가 싶었지만, 2023년 12월 구본무 회장의 유족인 세 모녀가 구본무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서 상속 분쟁이 불거졌다. 앞서 2018년, LG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11.28%를 구광모 회장에 8.76%, 장녀 구연경 대표에게 2.01%, 차녀 구연수 씨에게 0.51%를 상속한 바 있다. 당시 구연경 대표 등은 지분을 적게 받는 대신 5,000원 규모의 개인자산(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을 받기로 해 별다른 분쟁 없이 합의가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후 세 모녀 측이 故구본무 회장의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상속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했다. 이에 구광모 회장 측은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기존의 상속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구광모 회장은 15.9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서 LG그룹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5월 31일, LG그룹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준) *참고 : 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에는 이사회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LG그룹은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봤을 때, 이번 분쟁이 구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분 외에도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 가족 간 합의 등 다양한 요인이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장자 승계 한계’ 비판도.. 거버넌스 개혁 필요 LG그룹은 그동안 장자 승계를 통해 경영의 안정성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상속 분쟁과 경영권 갈등은 전통적인 승계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점도 있다. 특히, 총수일가 내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주의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ESG 경영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 투명성이 강조되는 기업 환경에서,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LG그룹은 전통적인 승계 방식을 재검토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이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2-25 14:21
-
![[이슈분석] '중복 상장' 논란.. HD현대로보틱스 상장설 왜 나왔나?](//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3875208041_b91e30_118x118_c1.png)
[이슈분석] '중복 상장' 논란.. HD현대로보틱스 상장설 왜 나왔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HD현대로보틱스(대표이사 강철호)의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HD현대그룹의 '중복 상장'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9개의 계열사를 상장한 HD현대(코스피 267250, 권오갑 / 정기선) 그룹이 또 추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회사인 HD현대의 기업 가치 희석과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 측은 이번 상장설을 부인하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에 업계에서는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 가능성을 계속 점치고 있다. 물론,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설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18~2022년, HD현대그룹이 현대오일뱅크(대표이사 송명준)와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재을)의 상장을 준비했다가 철회한 이력이 있다. 당시에는 각 시장 상황에 따라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현대마린솔루션(코스피 443060, 대표이사 이기동)을 상장시키기도 했다. HD현대그룹은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열사들의 연이은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지주사의 유동성 할인 문제를 야기하고, 주주들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열사 상장시 유동성 할인 문제는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지주사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로도 지적된다. 그래서 중복 상장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실제로 2023년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 당시에도 지주사인 HD현대의 주가는 하락했다. 계열사가 상장할 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열사의 가치를 사기 위해 지주사의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진다. 시장은 상장한 계열사 자체로 가치를 재평가하고, 주주들은 계열사의 주식을 직접 사면 된다. 이때, 지주사의 투자 매력을 하락해 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개혁연대는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이 HD현대의 주가 하락과 모자회사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HD현대와 HD현대로보틱스 이사회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복상장이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국내 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국내 대기업들의 중복 상장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최근 상장한 LG CNS의 상장 추진과 관련해 "LG CNS의 가치가 지주사인 LG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 상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복 상장이 지주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지주사 주식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HD현대그룹은 계열사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주주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HD현대로보틱스가 실제 상장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기업들의 밸류업 추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2-24 18:03
-
![[단독] 케이뱅크 실수로 전세 계약금 날리게 생겨](//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401382618999_e234eb_118x118_c1.jpg)
[단독] 케이뱅크 실수로 전세 계약금 날리게 생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케이뱅크(최우형 은행장)가 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뒤늦게 부결 통보를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씨(남, 30대)는 “케이뱅크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업무 처리로 전세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집을 구하는 고객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사정이 생겨 급히 집을 구하던 A씨는 괜찮은 집을 발견해 전세대출 계약을 맺었다. 잔금일을 2주 정도 앞둔 A씨는 대출 관련 앱에서 정보를 입력했고, 케이뱅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 신청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케이뱅크 측의 요구에 A씨는 여러 차례 서류 보완 요청에 응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 돌아온 대답은 대출 미승인 통보였다. 부결 사유를 알기 위해 A씨는 케이뱅크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케이뱅크 측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문이 든 A씨는 HF 측에 보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HF측은 "케이뱅크로부터 보증 신청 자체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의문이 든 A씨는 케이뱅크 측에 해당 사실을 문의했고, 케이뱅크 측은 “보증 때문이 아니라, 재직 확인 등 추가 심사를 위해 대면 심사를 해야하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시스템상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대출이 어렵다. 다른 시중은행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케이뱅크 측에 “왜 말이 계속 바뀌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케이뱅크 측은 “상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상담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민원 처리는 계속됐고 시간은 흘러갔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케이뱅크 측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늦은 부결 통보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도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A씨는 케이뱅크 측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지적했다. 케이뱅크가 처음에는 부결 사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거절을 언급했다가, 또 다음에는 대면 심사 불가 때문이라는 등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HF 측은 두차례 케이뱅크로부터 보증 신청을 받았고 100%는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 보증이 가능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장 관련으로 부결 처리를 하려면 애초에 대출을 신청하자마자 좀 거절해서 다른 곳을 이용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며 “대출을 신청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서 거절하면 고객은 어떡하나. 대출 거절 사유가 세입자에게 있으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시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이번 민원은 대출 상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보다는 대출 심사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실 여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출 심사 관련 상담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상담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했다”며 “다만, 대출 부결에 대해서는 정책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케이뱅크의 이번 대출 부결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금감원이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대출 심사 여부와 계약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신청자는 계약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구성해놓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해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2-21 16:26
-
![[이슈분석] 삼성전자 새롭게 이사회 구성, "다만, 허점은 여전"](//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400351842802_32ff37_118x118_c1.png)
[이슈분석] 삼성전자 새롭게 이사회 구성, "다만, 허점은 여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18일 이사회 개편을 단행하며 반도체 전문가 3명을 새롭게 이사회에 지명했다. 기존 10명의 이사진 중 임기가 만료된 3인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변화는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에 선임된 3인 모두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하다가 기술력 부문에서 3위까지 밀려난 상황이다. 반도체가 현재 삼성전자의 유일한 성장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사회를 반도체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사회 구성에 대한 아쉬운 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기존 이사회, 반도체 전문가 부족 논란 삼성전자 기존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외이사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금융, 투자, 정부기관 출신이 많아, 정작 회사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전문가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중 30~40%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반도체보다는 금융과 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년간 하만(Harman) 인수를 제외하고 뚜렷한 투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 이사회 구성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반도체 전문가 3인, 이사회 전격 합류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가 3인을 영입할 예정이다다.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송재혁 메모리사업부 CTO(최고기술책임자)가 선임됐으며, 사외이사로는 이혁재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소장이 합류했다. 이들 모두 반도체 분야에서 탄탄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이번 인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반도체강자 삼성전자, "더 이상은 아니야"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해온 것이다. 그러나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AI 연산에서는 퀄리티보다 '양'이 중요해지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HBM은 기존 디램(DRAM) 칩을 여러 층으로 수직 적층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며, 단 한 층이라도 결함이 발생하면 제품 전체가 불량이 되는 등 양산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도 단순한 원가 경쟁력보다 '기술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HBM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디램 적층 기술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램 자체의 양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적극 영입한 것은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사업은 해외에서, 경영진은 국내에서? 반도체 전문가 3인의 이사회 합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이사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첫째,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원 100%가 한국인이다. 삼성전자의 주요 시장과 생산시설이 해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외국인 이사진이 아예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이사회 구성원을 외국인으로 채우지 말라는 법도 없다. 둘째,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이재용 회장의 부재도 논란이다. 삼성그룹의 핵심 의사결정은 사실상 이재용 회장이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공식적인 이사회에는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구조가 경영 투명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번 이사회 개편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사회 구성 다변화와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이사진과 함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슈분석---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http://app.aistudios.com/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2-21 09:50
-
![[이슈분석]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전량매도 위기'](//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398845324978_a7f270_118x118_c1.png)
[이슈분석]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전량매도 위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지난 17일,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이 재발의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지는 삼성생명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금산분리와 연결되는지 자세히 분석해보려 한다. 10년 넘게 계속된 입법 시도, 이번엔 다를까? 삼성생명법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7일 다시 발의된 만큼,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평가할 때 기존의 취득원가(구입 당시 가격)가 아닌 현재의 시장가격(시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과 삼성생명의 문제점은?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총자산이 100이라면 계열사 지분가치는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 시가로 환산하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식 평가 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삼고 있어, 삼성생명이 1980년대 주당 1,072원에 매입한 가격이 보유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중이다. '금산분리'가 핵심.. 삼성생명법의 목적은? 삼성생명법의 핵심 취지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다. 이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금산분리가 적용되면, 삼성생명(금융사)이 삼성전자(비금융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비금융사 지분 보유를 1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1.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합산하면 10%에 근접한다. 딱 10%로 맞춰진 것은 우연이 아닌 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것이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삼성생명에 불리'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올해 2월까지 3조 원(발행주식의 0.8%)을 소각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즉,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사주 소각이 계속되면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51%만 금산분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화재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10%가 넘는지 안넘는지를 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열사 금융사의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이 함께 평가될 수밖에 없다. 삼성 대주주들의 상속세 부담, 주주환원 확대 신호? 한편, 삼성 총수 일가는 2021년부터 매년 약 2조 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약 4조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최근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법, 한국 재벌 지배구조 개혁의 시금석 될까? 삼성생명법은 단순히 삼성그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기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생명법의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2-19 09:43
-

"할인 경쟁이 빚으로"... 실적 압박에 삶을 포기한 BMW 영업직원의 비극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BMW 코리아(대표이사 한상윤) 공식 딜러사에서 근무하던 영업직원 A씨(39, 남)가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소재 BMW 신차사업부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차량 판매를 위한 치열한 할인 경쟁 속에서 실적을 맞추기 위해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 딜러 사이의 할인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할인율을 맞추기 위해 부채가 쌓였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다수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거나, 영업직원의 과도한 실적 압박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는 등 다양한 댓글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BMW 코리아 측은 사건에 대해 "딜러사의 한 영업 직원이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딜러사는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영업사원 및 세일즈 컨설턴트를 채용 중이며, 연봉 50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인한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 환경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이는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사건이 과도한 실적 압박이나 부당한 업무 관행과 연관되어 있다면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단순 업무 스트레스, 압박감 등으로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실적 압박,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추락사 등 물리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와 달리 산업 재해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별 사안을 작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가 해당 사건의 경위와 본사의 조치를 묻기 위해 BMW 측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번 비극은 자동차 딜러 업계의 과도한 실적 압박과 경쟁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업계 전반에서 영업직원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2-18 17:38
-
![[리베이트의 비밀2]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은밀한 '뒷거래'](//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39786100325_2ee3aa_118x118_c1.png)
[리베이트의 비밀2]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은밀한 '뒷거래'
● 리베이트의 비밀 시리즈[리베이트의 비밀1] '처방전의 비밀'... 그 약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리베이트의 비밀2]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은밀한 '뒷거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지난 보도에서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정황이 처방전에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이번에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실태를 더욱 깊이 파헤쳐본다. 의약품 유통 구조와 리베이트의 연결고리 의료산업의 유통 구조는 제약회사 → 도매업체 → 병의원 → 약국 → 소비자로 이어진다. 병의원은 제약회사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고 있다. 도매업체는 소규모 병의원부터 대규모 종합병원까지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특성상, 제약사와 병원 간의 은밀한 리베이트 거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1. 도매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간접지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들은 직접 제약회사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구조다. 즉, 제약사는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해야만 매출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제약사는 어떻게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까?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도 있지만, 도매업체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원래 100만 원에 팔던 의약품을 80만 원에 공급한다고 가정해보자.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물량을 20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셈이므로, 남은 20만 원이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자금이 된다. 도매업체는 이 자금을 활용해 일정 금액을 챙긴 뒤, 나머지를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전달한다. 이렇게 제약사 → 도매업체 → 병의원으로 이어지는 리베이트 구조가 형성된다. 2. 비밀 계좌를 통한 현금 지급 일부 제약사는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약사 영업사원의 비밀 계좌를 활용한 리베이트 지급 방식이 그중 하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하 이니스트)이 있다. 이니스트는 2016년부터 영업사원들에게 두 개의 계좌 개설을 지시했다. 하나는 일반 급여 계좌, 다른 하나는 리베이트 자금이 입금되는 비밀 계좌였다. 회사는 매달 영업사원들의 비밀 계좌에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송금했고, 영업사원들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직접 의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방식은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병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당시 밝혀진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비율은 40%였다. 즉, 한 의사가 1,000만 원어치의 이니스트 의약품을 처방하면, 4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3. 랜딩비(Landing Fee) : 미리 지급되는 리베이트 리베이트 지급 방식 중 또 다른 형태는 '랜딩비(Landing Fee)'다. 랜딩비란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특정 의사와 신규 거래를 맺을 때, 향후 6개월~1년 치 리베이트를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약사는 의사에게 "우리 의약품을 일정량 처방해주면, 예상되는 수익의 1년 치를 한 번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리베이트를 미리 받을 수 있고, 향후 처방을 통해 안정적인 추가 수익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 한국지사 임원진이 병의원에 랜딩비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특정 병원과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선지급한 정황이 밝혀졌다. 위의 리베이트 지급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 유통 경로를 독점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자체 도매업체를 설립하는데, 이는 리베이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병원이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사 병원에 유리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경쟁 업체를 배제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 약값 상승 초래, '소비자도 피해'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리베이트 지급 비용을 회계상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 처리한다. 이는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오며, 결국 탈세로 이어진다. 즉,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리베이트 비용을 떠넘기면서도 세금을 줄이고,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약국의 리베이트 수수 실태 이번 기사에서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실태를 조명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는 병의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약국 역시 제약사 및 도매업체와 리베이트 거래를 하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 다음 보도에서는 '약국 리베이트'의 실태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2-17 16:09
-
![[이슈분석]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상승 신호? 착각?](//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5139313165_6308a5_118x118_c1.png)
[이슈분석]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상승 신호? 착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강남구 주요 지역에 시행했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실거주자만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실효성 문제를 감안한 결과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을 시장 상승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 감소… 대출 규제가 원인? 서울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지만, 지난해부터 매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3년 7월 9,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8월 6,520건, 9월 3,168건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꼽힌다. 특히,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강화되면서 대출 심사가 엄격해졌고,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은 장기투자… 구조적 문제 접근 필요 부동산은 단기적 시장 변동성이 크지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자산이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매수는 3040대, 매도는 50대 이상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3040대가 전체 거래의 64%를 차지하며, 주요 매수층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매도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으로 나타난다. 50대 이상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증가하는 희망퇴직이다. 대기업에서도 희망퇴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KT는 4,400명의 직원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5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퇴직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끊기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인들의 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현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커지는 3040의 부채 부담 현재 30~40대는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이들의 재정 상태는 위태로운 편이다. 30대의 부채비율 중앙값은 자산 대비 49%, 40대는 32% 수준이다. 통계에 집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채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약 4억 9천만 원이 대출인 셈이다. 고금리 시대에 이러한 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소비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절벽 전문가들은 환율과 금리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감소를 지목하고 있다. 1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2023년에 이미 은퇴했으며, 2세대 역시 은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다. 현재 한국의 출생아 수는 0.72명 수준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명에 한참 못 미친다. 향후 주택 매수세를 이끌어갈 30~4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구조적으로 공급(50대 이상의 매도)은 증가하고 있지만, 핵심 매수층(30~40대)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단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2-14 15:46
-
![[ENG/팟캐스트] MZ세대가 국민연금을 못믿는 이유 ① / Why MZ Demands National Pension Abolition ①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개인연금](//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5091650407_0edb0c_118x118_c1.jpg)
[ENG/팟캐스트] MZ세대가 국민연금을 못믿는 이유 ① / Why MZ Demands National Pension Abolition ①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개인연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ENG]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 ① / Why MZ Demands National Pension Abolition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금 #국민연금조기수령 #MZ 영상편집 : 곽중희 기자
- 곽중희 기자
- 2025-02-14 14:01
-
![[이강훈 칼럼] 국가 주도 AI 펀딩 : 스타트업·국민·국가가 함께 가는 길](/data/photos/20250207/art_1739500205868_bcf55e.gif)
[이강훈 칼럼] 국가 주도 AI 펀딩 : 스타트업·국민·국가가 함께 가는 길
● 챗GPT와 딥시크 - AI 관련 시리즈 [이슈분석] 딥시크가 이끈 LLM 대격변.. “논문 봤더니?!” [이슈] 정부-기업, '딥시크 사용 금지령'... 정보 유출 우려 [이슈] 딥시크, 위조 계정·허위 정보 주의 당부…각국 차단 조치 속 첫 공식 입장 [이강훈 칼럼] '딥시크와 챗GPT' 열풍... 생성 AI, 미래의 핵심 경쟁력은? [이강훈 칼럼] 딥시크 충격, 소형 범용 모델이 AI 산업 이끈다 [이슈분석] 한국은 왜 ‘딥시크’ 못 만드나? [이강훈 칼럼] 한국형 AI 인력 10만 양성, 가능할까? [이강훈 칼럼] 국가 주도 AI 펀딩 : 스타트업·국민·국가가 함께 가는 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강훈(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및 주식회사 퀀텀아이 대표) 기고, 곽중희 기자 편집 | 최근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의 해외 매각 논의가 뜨거운 이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단순히 "세금으로 키운 기업이 해외에 넘어가니 아깝다"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 방식은 대부분 보조금 지급 형태였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낮고, 기업이 성장해도 국민이 그 성과를 직접적으로 공유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 회수를 전제로 한 ‘국가 주도 펀딩’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 주도 펀딩이 필요한 이유 현재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방식은 R&D 지원금, 정책자금 대출, 보조금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정부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국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기업이 성장할 때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수익을 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방식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도 단순히 "세금으로 지원했다가 기업이 해외에 넘어가면 끝"이 아니라, 국가가 지분을 갖고 투자하여 기업의 성장과 함께 국가도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주도 펀딩이 성공하려면? 국가 주도 펀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① 투자 결정의 정치적 개입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투자 결정을 하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을 밀어주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려면, 독립적인 국가 투자 펀드 운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한 전문 투자 기관이 필요하다. ② 투자 실패에 대한 국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 펀드는 단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략을 적용해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펀드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해외 매각 시에도 국내 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퓨리오사AI 같은 스타트업이 해외에 매각될 때, 국가가 보유한 지분을 유지하거나, 핵심 연구개발(R&D) 거점이 국내에 남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기업이 인수하더라도 국내 협력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민관 공동 투자 모델: 성남시 사례 국가 주도 펀딩의 또 다른 방식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하는 모델이다.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당시 성남시는 100% 공공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 공동 투자 방식을 도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개발 이익 5,503억 원을 확보했고, 민간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을 스타트업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AI·반도체 펀드가 조성되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면, 기업 성장과 국가 이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민관 공동 투자 방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 대장동 사례에서도 공공이익과 민간이익 간의 균형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공공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민관 공동 투자는 정책적 리스크가 크다. 공공이 개입하는 만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투자에 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료적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동 투자할 경우,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공 투자가 실패할 경우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며, 반대로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공공의 역할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 결국, 민관 공동 투자 모델은 신중한 설계와 감시가 필요하다 국가 주도 펀딩의 실현 가능 방안 국가 주도 펀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① 국가 혁신 스타트업 펀드 조성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 정부가 50%, 민간이 50% 출자하여 공동 운영. 투자 기업이 해외에 매각될 경우, 정부 지분 유지 및 기술 유출 방지 조항 포함. ② 스타트업 주식형 펀드 도입 정부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국민이 일부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 국민연금, 공공기관 연기금이 참여하여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 ③ 해외 매각 시 국내 기여 조건 부여 해외 인수 기업이 국내 연구소 및 대학과 협력 필수. 인수 후에도 국내에 R&D 거점 유지. 국내 협력사와의 협업 조건을 계약에 포함.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지원 모델 퓨리오사AI 매각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 매각이 나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세금을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가 주도 펀딩을 통해 스타트업, 국민, 정부가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투자 기구 운영, 정치적 개입 방지, 글로벌 투자 유치와의 균형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기업도 성장하고, 국민도 이익을 얻고, 국가도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공동 번영 모델’을 구축할 때다. 국가 주도 펀딩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 기고 l 이강훈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및 주식회사 퀀텀아이 대표) 기고인 이강훈은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연구소는 2018년 4월 19일에 설립되어,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와 대중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 소장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퀀텀아이도 운영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5-02-14 11:37
-
![[이슈분석]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 수익구조의 붕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397860091848_cf7a09_118x118_c1.png)
[이슈분석]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 수익구조의 붕괴
●국민연금 고갈, 청년의 미래는?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 수익구조의 붕괴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② : 명목뿐인 개혁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연금 개인화 시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국민 폰지사기 아니냐", "연금개혁으로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 최근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명 MZ세대(2030 젊은 층을 뜻하는 말)에서는 '국민연금 폐지'의 목소리가 더욱 짙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의 고갈 여부는 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MZ세대에 속하는 기자가 ①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운용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②정부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는지, ③도래할 연금 고갈 위기에 MZ세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분석해보려 한다. 이번 보도에서는 ①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운용 현황을 간단하게 분석해본다. ● 국민연금의 두 축 '보험료와 운용수익' 국민연금의 고갈 논란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의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수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연금보험료, 운용수익, 국고보조금이다. 1.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는 국민이 근로를 통해 버는 급여에서 내는 보험료를 뜻한다. (지난 5년 수익, 약 266조 원) 2. 운용수익 : 국민연금이 자금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내는 수익금 ( 지난 5년 수익, 약 283조 원 / 2024년 11월 기준 누적 수익금 약 711조 원) 3. 국고보조금 : 국가로부터 국민연금에서 지원받는 수익 (0.01조 원) 이처럼 국민연금의 자금은 대부분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에서 나온다. 즉, 두 수익금이 국민연금 자산의 가장 큰 두 축이다. 여기서 한계가 발생한다. 하나의 수익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다른 한 쪽에서 매꿔야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추가로, 기금운용수익은 투자를 통해 운용하는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국민연금을 운용수익만으로 이끌어 가는데는 위험성이 높다. 일례로, 2022년에는 국민연금이 -8.2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약 80조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은 국민연금 자산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두 개념은 별개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쪽이 부실해지면 안정성이 위험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인구 절벽, 국민연금 생명과 직결 국민연금 수익의 주축 중 하나인 연금보험료는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보험료는 국민 중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노동을 해서 납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을 기점으로 2035년 3400만 명, MZ세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20년 뒤에는 2419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반면,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는 2배이상 증가해 174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진다. MZ세대에게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국민연금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약 2,181만 명으로, 2024년 말 대비 57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2년 연속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도 전년(11만 3,000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 MZ는 어떡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자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32년 뒤인 2057년 1월(65세)부터 받게 될 시, 월 약 91만 원으로 추정됐다. 물가상승률과 여러 경제지표와 함께 개인 투자 수익과 비교해보면, 썩 마음에 드는 금액은 아니다. 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살 길을 찾기 위해 이제는 MZ세대도 연금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을 꼼꼼이 따질 때가 왔다. 다음 보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하고 있는 제도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2-13 18:38
-
![[이슈분석5] 고려아연 분쟁, MBK·영풍 "아주 자신있다"](//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4104092818_b55770_118x118_c1.png)
[이슈분석5] 고려아연 분쟁, MBK·영풍 "아주 자신있다"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이슈분석5] 고려아연 분쟁, MBK·영풍 "아주 자신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과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고문)·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상호주(相互株) 의결권 제한’의 적용 여부이며, 이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고려아연 자회사인 SMC(선메탈코퍼레이션, 이하 SMC)의 법적 정체성이다. SMC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경영권 분쟁 핵심 쟁점이 된 'SMC의 법적 형태' 이번 사태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C가 지난 1월 22일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매입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거래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이 서로 상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주 의결권 제한(상법 제369조 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SMC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될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만약 SMC가 유한회사라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이 유지된다. 반대로 주식회사라면 영풍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차이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 형태로, 상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다. 반면, 유한회사는 소수의 구성원이 출자해 설립하며,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외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유한회사는 구성원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진다는 '유한책임'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유한회사라고 불린다. 즉, SMC가 유한회사라면 상법 적용을 덜 받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 “SMC는 유한회사” 주장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SMC가 유한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두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했다. SMC는 호주의 법상 ‘Proprietary Limited’ 유한회사 김 부회장은 SMC가 호주 회사법상 ‘Proprietary Limited(PTY LTD)’ 형태의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용어 자체가 ‘비공개 유한회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SMC는 유한회사라는 것이 그의 논리다. 고려아연, 스스로 ‘유한회사’ 명시 후 번복 또한,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1월 22일 SMC의 영풍 지분 취득 당시 공식 문서에서 SMC를 유한회사라고 명시했다가, 하루 뒤 이를 주식회사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려아연 스스로 SMC가 유한회사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SMC는 자본금, 주식, 주주 유한책임 등 특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로 봐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엇갈리는 프레임, 적대적 M&A vs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이번 사태를 두고 각기 다른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고려아연 측, “영풍·MBK 연합의 적대적 M&A” 고려아연 측은 이번 사태를 적대적 M&A로 규정하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공격적인 인수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경영권 방어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경영권 분쟁일 뿐” 반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적대적 M&A와 경영권 분쟁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들의 목적은 경영권 교체이지, 고려아연 자체를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 경영진이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주주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속되는 소송, 고려아연의 미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임시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결의안들에 대해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번 법적 공방은 3월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의 경영권 구도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2-13 13:52
-
![[이강훈 칼럼] AI 인력 10만 양성, 정말 비효율적인가?](/data/photos/20250207/art_17394140385874_4b725a.gif)
[이강훈 칼럼] AI 인력 10만 양성, 정말 비효율적인가?
● 챗GPT와 딥시크 - AI 관련 시리즈 [이슈분석] 딥시크가 이끈 LLM 대격변.. “논문 봤더니?!” [이슈] 정부-기업, '딥시크 사용 금지령'... 정보 유출 우려 [이슈] 딥시크, 위조 계정·허위 정보 주의 당부…각국 차단 조치 속 첫 공식 입장 [이강훈 칼럼] '딥시크와 챗GPT' 열풍... 생성 AI, 미래의 핵심 경쟁력은? [이강훈 칼럼] 딥시크 충격, 소형 범용 모델이 AI 산업 이끈다 [이슈분석] 한국은 왜 ‘딥시크’ 못 만드나? [이강훈 칼럼] 한국형 AI 인력 10만 양성, 가능할까? 이강훈(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및 (주)퀀텀아이 대표) 기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편집 | 최근 인공지능(AI) 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AI 산업이 단순한 인력 숫자가 아니라 질적 수준이 중요하다는 점은 맞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목표 설정 없이 AI 인력 양성이 가능할까? AI는 단순히 연구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AI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인공지능 응용 개발자, 기업 내 AI 활용 인력까지 폭넓게 필요한 시대다. 따라서 단순한 ‘숫자 목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재 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미국과 중국도 AI 인력 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AI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상징적 숫자 목표도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이 중요한 문제다. ‘한국형 AI’는 내수 전략일 뿐인가? ‘한국형 AI’라는 개념이 내수 시장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해석이다. 미국에서 개발된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영어 기반이며, 중국의 AI 모델도 중국어 중심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내수 전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형 AI’는 단순한 언어모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데이터와 환경을 반영한 AI 모델을 의미한다. 또한, 글로벌 AI 시장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한국어와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한국형 AI’를 내수 전략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한국 AI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오류다. 한국어 AI 모델이 발전하면, 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SOTA 연구만이 AI 경쟁력의 핵심인가? 일각에서는 한국 AI 연구가 SOTA(State Of The Art) 연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SOTA 연구란 기본적으로 기존 모델을 일부 개선해 특정 벤치마크 점수를 올리는 방식이다. 과연 한국 AI 경쟁력이 단순한 SOTA 연구로 확보될 수 있을까? AI 기술 패권을 주도하는 국가는 단순한 모델 성능 개선이 아니라, 기초 연구와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을 병행하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한 것은 단순히 SOTA 연구 경험 때문이 아니라, 수학, 물리, 컴퓨터과학 등 기초 학문을 튼튼히 다지고, 장기적인 연구 투자와 논문 발표를 지속한 결과다. 한국도 단순한 SOTA 경쟁이 아니라, 기초 연구와 응용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 AI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구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AI 경쟁력은 기초 연구와 응용의 균형에서 나온다. AI는 연구자만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도 중요하다. AI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 소프트웨어 최적화 등의 연구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AI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AI 경쟁력은 연구 개발(R&D)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비즈니스와 산업에 활용하는 응용 기술에서 결정된다. 즉, 한국의 AI 정책은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과 연결된 응용 AI 개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연구 성과만으로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 전략이 필요하다. AI 정책은 단순한 목표 수립과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행력과 방향성이다. AI 인력 양성: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형 AI 모델: 내수 전략이 아니라,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AI 연구 생태계: 단순한 SOTA 연구 중심이 아니라,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산업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이 AI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AI 정책은 숫자만이 아니라, 그 목표를 어떻게 실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인지가 핵심이다. 국가 AI 정책, 방향 수정보다 실행이 중요 ‘한국형 AI’와 AI 인력 10만 양성에 대한 비판은 의미가 있지만,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AI 인력 양성은 숫자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과 함께 추진해야 하며, 한국형 AI는 내수 시장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필수 요소다. AI 경쟁력은 단순한 최신 기술 따라잡기가 아니라, 기초 연구와 응용, 산업 연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한 반론과 비판이 아니라, 한국 AI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 기고 l 이강훈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및 주식회사 퀀텀아이 대표) 이강훈 소장은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연구소는 2018년 4월 19일에 설립되어,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와 대중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 소장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퀀텀아이도 운영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5-02-13 1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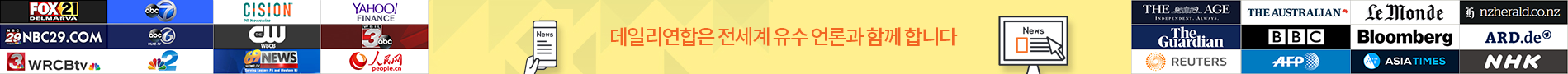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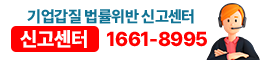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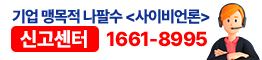


![[ESG]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해외 350여 언론 주목… ‘지구촌 회복 위한 정신적 가치·실천’ 피력](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5597612517_e53378_118x118_c1.jpg)
![[이슈분석2] 티웨이항공, 대명소노그룹 말대로 "위기일까?"](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1612119408_5295f0_118x118_c1.png)
![[이슈탐사] LG그룹 상속분쟁 ① : 막장드라마 찍는 LG그룹 구광모 회장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0/art_17410627823216_9a11b3_118x118_c1.jpg)
![[이슈분석] '중복 상장' 논란.. HD현대로보틱스 상장설 왜 나왔나?](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3875208041_b91e30_118x118_c1.png)
![[단독] 케이뱅크 실수로 전세 계약금 날리게 생겨](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401382618999_e234eb_118x118_c1.jpg)
![[이슈분석] 삼성전자 새롭게 이사회 구성, "다만, 허점은 여전"](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400351842802_32ff37_118x118_c1.png)
![[이슈분석]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전량매도 위기'](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398845324978_a7f270_118x118_c1.png)

![[리베이트의 비밀2]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은밀한 '뒷거래'](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39786100325_2ee3aa_118x118_c1.png)
![[이슈분석]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상승 신호? 착각?](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5139313165_6308a5_118x118_c1.png)
![[ENG/팟캐스트] MZ세대가 국민연금을 못믿는 이유 ① / Why MZ Demands National Pension Abolition ①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개인연금](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5091650407_0edb0c_118x118_c1.jpg)
![[이슈분석]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 수익구조의 붕괴](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397860091848_cf7a09_118x118_c1.png)
![[이슈분석5] 고려아연 분쟁, MBK·영풍 "아주 자신있다"](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4104092818_b55770_118x118_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