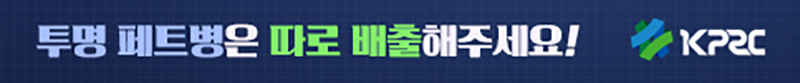교육부가 '졸업유예제' 폐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학생 의미를 '학적에 등록된 학생'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졸업학점을 이수했으나 졸업논문 등을 제출하지 않은 '수료생'의 경우 앞으로는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로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졸업유예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대학가에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통계처리 지침'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했으나 졸업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적에 등록이 된 경우에만 재학생으로 보는게 맞다"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도 학적에 등록되면 재학생으로 포함시키도록 대학에 안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적부에 올라와 있는 학생을 뜻하는 '재적생'은 보통 재학생, 휴학생만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점은 이수했지만 졸업요건을 채우지 않은 '수료생'의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신분을 정하도록 돼 있어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대학들은 그동안 이수학점을 충족했으나 논문 미제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돈을 내고 추가 학점을 수강하지 않아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 주는 '졸업유예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졸업유예제'를 폐지하고 학점을 등록해야만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 주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이 정규학기(8학기) 이상을 다닐 경우 신청학점 3학점 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6분의 1, 6학점 이하는 등록금의 3분의 1을 납부하고 있으며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은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재학생으로 인정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제도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료생을 제적생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수료생이 학적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재적생으로 보는게 맞고 학적에 등록되면 재학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수료생에게도 재학생 신분을 부여한 '졸업유예제'를 폐지하고 1학점이라도 등록해야 재학생으로 인정하기로 제도를 바꾼 것은 2023년까지 대입정원 16만명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때문이다.
특히 '전임교원확보율'은 재학생 숫자 대비 전임교원수를 따지기 때문에 재학생 신분인 졸업유예 학생이 많을 수록 불리해 질수 있다.
하지만 재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기업들의 신입사원 선발 방식과 각종 공모전 탓에 학생들은 졸업후에도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졸업유예자'가 재학생으로 잡힐 경우 재학생 숫자가 많아져 '전임교원확보율'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학생 충원율' 지표나 '취업률' 산정에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며 "평가지표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졸업유예자가 많을 수록 대학평가에 불리하다고는 볼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