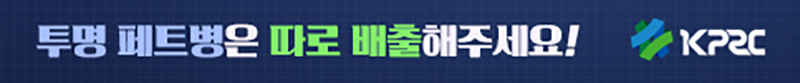#2 지난 2004년 12월 대전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모(당시 42세)씨가 10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확대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국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 있던 칼집을 감은 테이프 안쪽 접착면에서 쪽 지문이 발견돼 8년 만에 사건이 해결됐다.
#3 지난 2004년 3월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다세대 주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강도강간을 저지른 피의자 A씨가 지난 1월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현장에 지문을 남기고도 10여 년간 경찰 수사를 피해갈 수 있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장기 미제사건들이다. 당시에는 수사기법 등이 발달하지 않아 오랫동안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다가 최근 경찰청의‘미제사건 전담팀’에 의해 해결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을 해결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더욱이 최근에는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부터 신종범죄까지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범행현장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완전 범죄는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증거 중심의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담당 수사관들의 노력과 첨단 수사기법, 장비의 도움으로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9월 강·절도 미제사건 697건 중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해 9년 전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한 야간 강도상해 사건 등 385건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를 일선 경찰서에 통보해 110명(범행당시 미성년자 89명, 성인 21명)을 검거했으며, 148건은 수사 중이다.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385명 중에는 미성년자가 194명으로 전체 신원확인 대상자 중 가장 많은 50.4%를 차지했다. 이어 성인 140명 36.4%, 외국인은 51명으로 1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 발견 이후 검거 기간은 2주 이내(58건, 53.9%)가 가장 많았다. 2주~1개월 이내(28건, 25.9%), 1~2개월 이내(11건, 10.1%), 2개월 이상(11건, 10.1%)이 뒤를 이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미제로 남은 3032건에 대한 지문 재검색을 벌여 지난 7월말 기준 1143명의 신원을 밝혀냈고 329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이런 과학수사는 지난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리·신설되고 1963년 시·도경찰국 수사과에 '감식계가 신설되면서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 지난 1999년 지문계와 감식계가 통합된‘과학수사과’가 신설돼 지금의 '과학수사센터'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지문감정이나 족 흔적 감식, 몽타주 수배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지문 분석과 유전자(DNA) 분석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도 감식이 어려웠던 지문의 극히 일부나 훼손된 것을 분석하는‘쪽 지문’과 머리카락, 침, 땀 심지어 대소변까지도 용의자의 흔적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
특히‘DNA 분석’은 동남아인이 연루된 살인 사건에서 DNA만으로 피의자의 국적을 정확히 맞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용의자의 종족이나 피부색 등은 물론 동식물의 구체적인 개체 식별도 가능하다.
또한, △핏방울의 위치와 크기 등을 토대로 범행을 재구성하는‘혈흔형태 분석’△손바닥 지문을 활용하는‘장문 분석’△범인 추적과 용의자 구별에 개를 이용하는‘체취증거 기법’△CC(폐쇄회로)TV 영상 속 걸음걸이 특징을 분석하는‘걸음걸이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곧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자동 얼굴인식 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남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