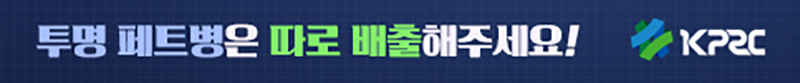▲ 국내 법의학자 수가 부족하고 검시 제도 후진성 또한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헬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사체를 단순 노숙자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며 초동수사에 실패했던 것은 검시 제도의 후진성과 법의학자 부족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검시의 모든 과정을 법의관이 총괄 지휘하는 미국, 유럽과 달리 업무가 4단계로 복잡하게 진행되는 국내 검시 제도의 후진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법의학 교육을 받은 정식 법의학자는 국민 100만 명 당 한 명 꼴인 50명에 불과해 7만 명당 1명 수준인 일본, 15만 명당 1명인 미국과 비교해 대형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또 우리나라 검시 집행 책임은 검사가 담당하고 집행은 경찰관, 실무는 의사, 변사자 부검 여부 판단은 판사가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협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찰에서 지난 7월27일 '경찰 검시관'에 대한 증원을 발표했지만 전문의사가 아닌 보건계열 전공의 7~9급 일반직이어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을 부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또한 전공의 양성에 지원하는 비인기, 기피의학 전공 분류에 법의학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늘어나는 법의학자의 수요에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한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되는 부검 건수는 5300여 건에 이르나, 소속 법의학자의 수는 고작 2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부검 의뢰는 매년 5~10%씩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법의하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